20세기 최고의 서스펜스 스릴러가 칭해지는 빌 S. 밸린저의 <이와 손톱>이 <석조저택 살인사건>으로 돌아왔다. 고전적 스릴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답게, 이 영화는 1945년 경성을 배경으로 마치 한 편의 추리 소설을 읽어 내려가듯 '고전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진행된다. <시카고 타자기>가 일제시대 그 암흑을 '환락'으로 밝히는 경성의 유흥가를 그 시대 젊은이들의 피난처로 그려내듯, <석조저택 살인 사건>은 원작 1950년대 뉴욕의 불야성 대신 일본이 패망하고 새로운 시대의 흥청거림에 불을 밝히는 경성 거리 두 젊은이의 뜻하지 않은 만남과 사랑으로 연다.
순애보의 씨실 위로 법정 공방전의 날실이

돈이 없어 택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하연(임화영 분)을 자신의 특기인 마술로 구해준 가난한 마술사 최승만(고수 분). 그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그녀와 방을 나누어 쓰는 사이가 되다 결국 방을 함께 쓰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풍운의 꿈을 안고 떠난 부산 공연에서 아내는 그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호텔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한다.
경성 거리에서 만난 가난한 선남선녀의 순애보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비극의 한 편에서 노회한 변호사 윤영환(문성근 분)과 서릿발 같은 검사 송태석(박성웅 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공방전이 벌어진다.
그렇게 범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벌어지는 법정 공방전과 최승만의 순애보는 서로 엇갈리며 비극적 순애보의 여정을 달군다. 그리고 한 시간여, 법정에서 살인범으로 잡힌 남도진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맞춰 이빨을 뽑아내며 자신을 바꾼 채 아내를 죽인 살인범을 쫓던 최승만의 눈앞에 역시나 남도진이 등장한다. 영화는 아내의 죽음과 그 범인을 쫓는 최승만의 절박함을 앞세우며 악인 남도진의 등장을 '클라이막스'에 양보한다. 하지만 영화가 마무리 될 무렵, 과연 이런 전략이 최선이었을까란 물음표가 떠오른다.
영화가 이런 병렬적 구조로 이야기를 진행한 건, 원작의 서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빌 S. 밸린저의 <이와 손톱>은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처럼 범인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놓고 변호사와 검사가 벌이는 숨 막히는 공방전을 날실로, 그리고 최승만의 순애보를 씨실로 직조해간다. 그러기에 이런 원작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한 편의 추리 소설' 같은 영화가 되었다.
한 편의 추리 소설 같다는 행간의 아쉬움

하지만 흔히 ‘한 편의 추리 소설 같다’는 이 말이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에서는 고스란히 '단점의 노정'이 되고 만다.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미 치열한 법정 공방전과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젊은 남녀의 순애보는 그 사랑의 비극성을 배가시키고, 범인에 대한 상상력을 한껏 북돋운다. 소설이라는 것이 시각을 통해 수용되지만, 그 시각을 메우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라는 '기호'이고, 그 '기호'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통해 독해되어 뇌에서 '이미지화'한다. 그러기에 범인을 드러내지 않은 재판과 그 행간의 순애보는 범인을 추리하고, 그의 만행을 그리고 최후의 복수의 방식에 대해 한껏 '뇌'를 달군다.
하지만 영화는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다. 이미 관객은 김주혁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간 상황에서 그가 범인임을 기대하고 영화관에 입장한다. 무엇보다 그의 등장으로 남도진이란 캐릭터를 단번에 설명해 내며 영화 자체가 그 전의 장황한 설명조의 전개와 달리, 분명한 '스릴러'와 '복수극'의 장르를 분명히 하며 관객을 한껏 몰입시킨다. 이렇게 등장만으로도 '개연성'이 되는 존재를 굳이 한 시간여나 아낄 필요가 있었을까란 질문이 드는 시점이다.
법정 공방전과 순애보에 천착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남도진은 그의 악행을 '비바체'로 풀어낸다. 그러기에 당연히 최승만의 복수극도 간결하게 마무리된다. 여운으로 남겨진 것은 아내의 진실조차 덮을 수 있는 그의 순애보. 결국 '스릴러'를 빙자한 '러브스토리'였나?
물론 스릴러임에도 주제의식에서 '사랑'을 운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아내의 비명횡사를 성공적인 복수로 이끈 최승만의 '한 판 스릴러'이다. 그 스릴러의 주체는 최승만이지만, 그 주체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상인 남도진의 활약이 충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등장만으로도 존재감이 넘쳤던 남도진, 그와 최승만의 대결은 마치 이야기의 축약본처럼 나열형으로 스쳐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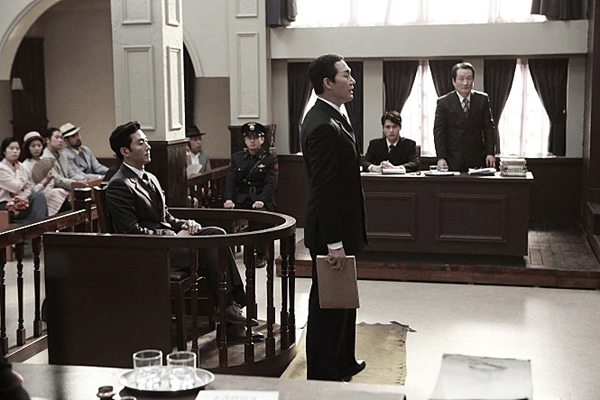
오히려 원작의 서술 방식을 털어버리고, 남도진과 최승만이라는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어땠을까. 장황한 서사보다, 남도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설명처럼 간결한 '브리핑'으로서의 순애보가 오히려 더 여운이 남지 않았을까? 한 사람에게는 순애보이지만, 또 다른 이에겐 그저 '유효한 이용가치'였던 화영에 대한 상상력을 더해도 좋았을 듯하다.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이렇게 좋은 추리 소설이 꼭 좋은 영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선례를 더한다.
물론 그럼에도 <기담>의 감독답게 근대 초 경성의 분위기는 한껏 '소설 같은 영화' 속으로 관객을 이끈다. 남도진, 윤영환, 송태석 등 등장한 캐릭터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영화를 설명해 낸다. 더욱이 스릴러의 대표적 원작답게 장황한 설명조의 서사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수의 정황을 예측할 수 없는 '기막힌 반전'은 이 영화의 미덕이다.
|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톺아보기 http://5252-jh.tistor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