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K교무 혼례식 날. 그가 근무했던 시카고교당 교도님들과 한국의 친지들이 항공편으로 속속 도착했다. 인연 있는 교무님들 역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곳곳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다. 마침 나는 예식이 열린 워싱턴교당에서 예비교무로서 실습을 나고 있었다. 손님맞이와 피로연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례는 전 원불교 미주 동부교구장님이 맡아주셨다.
뉴욕, 시카고, 한국, 메릴랜드를 넘나들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던 오래된 연인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둘이 나눈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터다. 마흔을 넘긴 신랑의 입이 그날은 옆으로 길게 찢어진 개구리를 닮아 온종일 함박웃음 가득했다. 진중한 사내가 개구쟁이 표정을 주체 못했다.
어두컴컴해질 무렵, 문이 열리며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 여러 개가 연회장에 도착했다. 찐 게다. 꽃게는 메릴랜드 주 명물로 동부 연안 대서양에서 건져 낸 물건이다. 모락모락 김을 내며 식탁 위에 올려진 붉게 잘 익은 꽃게에 하객들은 반색했다. 오직 한 사람 나만 예외였다. 알레르기가 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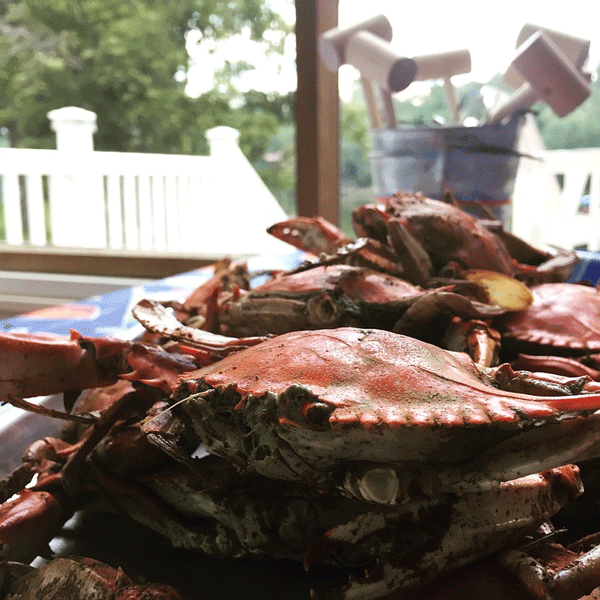
비단 꽃게뿐 아니라 바닷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와 연어, 참치 같은 등껍질이 딱딱한 물고기를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유혹에 못 이겨 행여 먹고 나면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가려움증, 안구충혈에 시달린다. 알러지 증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말처럼 가라앉지만 몹시 고통스럽다.
어려서부터 그러진 않았다. 외가 영덕에 갈 때면 대게를 자주 즐겼고 어머니가 끊여주신 꽃게탕은 밥도둑이었다. 성인이 되어선 종종 친구들과 참치 회를 곁들인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서른이 넘은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그 무렵 수행자가 되었다. 뭘 먹니 마니에 크게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다. 다만 바닷가 교당에 들를 때마다 정성으로 한 상 푸짐하게 마련해 주신 해산물 요리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매양 양해를 구해야 하니 죄송스러웠다. 교도님들이 나보다 더 미안해 하셨다.
하지만 아주 못 먹지는 않아 때론 붉은 생선회를 한 점씩 맛보며 임계치는 어느 만큼인가 장난스레 시험해 본다. 얼마 안 가 목이 붓고 쉬어버린다. 바로 젓가락질을 그치고 증세가 멎기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음식물 약간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몸이 신기하다. 한약으로 체질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으나 얼마 안 가 접었다. 가끔 불편하겠지만 몸의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골에 놀러온 조카와 누나, 자형을 보러 찐 영덕대게 한 상자를 들고 깜짝 나타나던 막내 외삼촌, 엄마표 꽃게탕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가족이 함께했던 저녁식사, 퇴근길에 동료들과 무한리필 참치 횟집에서 술잔을 나누던 풍경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그렇게 삼십 년 넘게 함께한 먹거리 중 몇 가지를 일상에서 가만히 놓는다.
돌아보면 음식 말고도 익숙하다 믿어온 존재와의 정서적 이별은 불현듯 다가온다. 특히 사람이 그러하다. 오랜만에 만나도 한결 같이 정다운 이가 있는 반면 영 어색해져버린 친구가 있다. 내 기억 속 그와 현재 그의 모습이 다르고, 그의 뇌리에 새겨진 나와 오늘의 내가 멀다.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다. 주고받는 말마다 서먹하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각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줄었다. 내 탓도 네 탓도 아니라면 그저 세월이 빚어낸 간극이다. 예전 같으면 내 마음 같지 않은 그와의 관계에 속상해서 벌어진 간격을 메꾸려 속앓이를 했겠지만 이제는 안타까움은 안타까움 대로 그냥 두기로 한다.
시절인연이 다 했다 여기고 담담하게 흘려보낸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기로 한다. 알러지 때문에 게맛을 포기했다고 게를 싫어하지 아니하듯, 엇갈린 우정일지라도 옛 벗의 무정한 태도에 섭섭해 하지는 않는다. 단지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다시 만나는 날 선연으로 맺어지기를 기도할 뿐이다.

